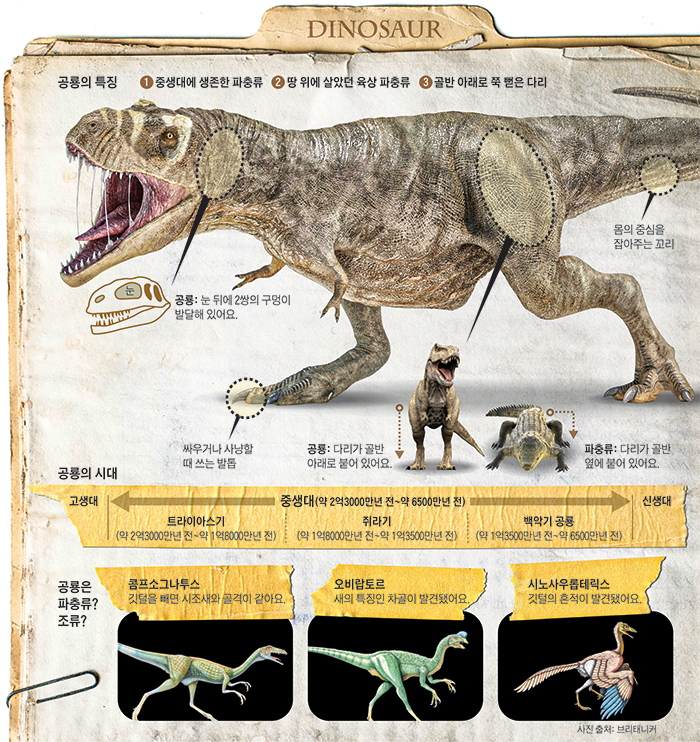[암각화 (巖刻畵)] ▲ 울산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모습. 하천 건너 보이는 평평한 암면이 반구대 암각화예요. / 남강호 기자 춤추는 주술사, 고래 50마리··· 바위에 새긴 선사시대 반구대 암각화, 너비 9.5m 높이 2.7m 호랑이, 창 든 사냥꾼 등 그림 307점 천전리엔 신라 때 새긴 한자도 있죠 울산광역시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국보 '천전리 각석(刻石)' 의 명칭을 '천전리 암각화 (巖刻畵)' 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요. '각석' 이란 '글자나 무늬를 새긴 돌' 을 말합니다. 1973년 이 유적이 국보로 지정될 무렵에는 바위 위에 글자와 무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각석' 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 (대곡리 암각화)' 와 마찬가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