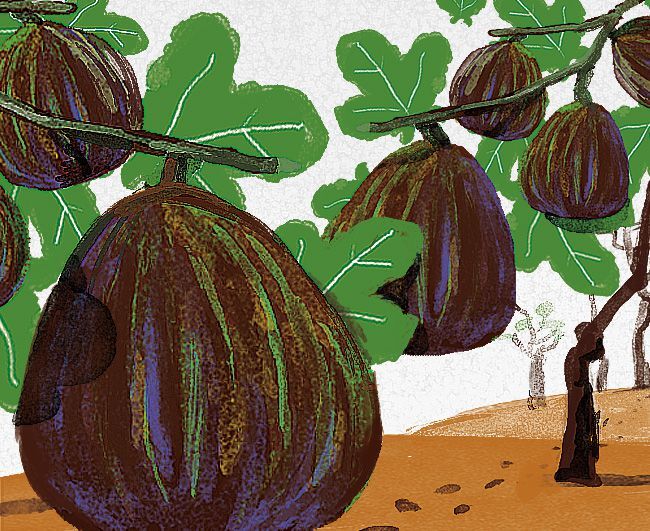[봄바람] 봄바람 현순애 집 나갔던 강생이 지난 계절 어디서 쏘다니다 왔는지 묻지 않기로 하자 한때 광야에서 드넓은 초원에서 갈기 휘날리던 수컷이다 명지바람 꽁지 붓끝에 묶어 탱탱이 부푼 젖가슴 건들건들 희롱하는, 허공에 대고 속살 여는 태어나는 것들의 아비다 봄 물결 출렁이는 목덜미 붉은 어린 사월이 초상 수채화로 완성하고 홀연히 떠나가는 화공이다 싱싱하게 물오르는 오월이년 엉덩짝 그리며 지느러미에 근육 만들고 있다는 풍문, 뜨겁다. 현순애 시인